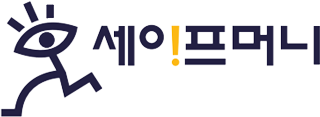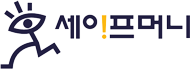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해 언급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발언은 예술정책의 핵심 가치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문화정책이 가져야 할 기본 윤리이자 세계 여러 나라가 공유해온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요체를 담고 있다. 즉, 정부는 예술을 지원하되, 그 내용과 방향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팔길이 원칙은 1940년대 영국에서 예술 지원 제도가 정립될 때 등장했다. 예술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이 의미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비개입'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역할과 예술계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균형 있게 협력해야 한다는 제도적 원칙이다.
국가는 예산과 정책을 통해 예술을 지원하고, 예술계는 그 자율적 판단을 통해 창작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처럼 '거리 두기 속의 책임 있는 지원'이 팔길이 원칙의 핵심이다.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예술이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일 때 그 본질적 자유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부의 지원이 예술가의 창작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어떤 파국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예술이 특정 정권의 기호나 이념에 종속될 때, 그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는 위축된다. 따라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화적 토대를 지키기 위한 윤리적 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팔길이 원칙은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우선 문화예술위원회나 관련 기금의 인사와 예산은 정부의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예술계 내부의 자율적 평가, 시민 참여, 학문적 검증이 결합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원의 기준이 정치적 친분이나 이념이 아니라 예술적 완성도·공공성·다양성 등의 객관적 평가에 기반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팔길이 원칙은 정부가 예술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예술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며, 국가가 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단지 그 책임을 수행하는 방식이 문제일 뿐이다. 국가는 방향을 정하거나 내용에 개입하는 대신, 예술의 생태계를 풍요롭게 할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술의 자율성과 국가의 책무성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두 축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이 한 문장은 예술의 자유를 지키는 약속이자, 국가의 품격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문화예술정책이 진정한 의미에서 팔길이 원칙을 구현할 때, 예술은 비로소 정치의 그림자를 벗어나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