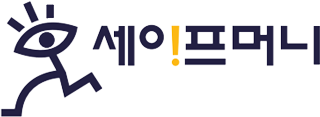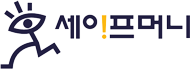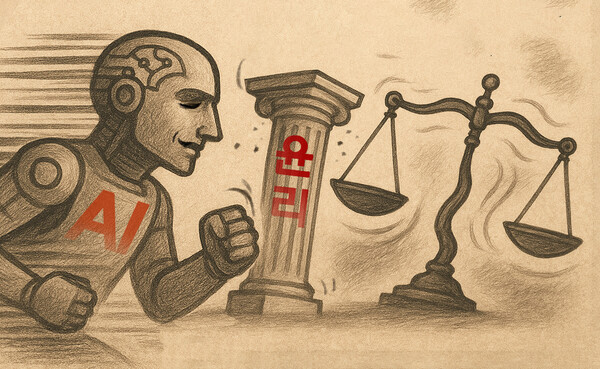
최근 국내 명문대에서 발생한 'AI 활용 시험 부정' 논란은 단순한 학사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근본적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생성형 AI가 논리적 글쓰기와 창의적 산출물까지 단 몇 초 만에 완성하는 시대, 기존 평가 방식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학생들의 시험 부정 논란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느리게 적응하는 제도가 빚어낸 윤리적 혼란의 결과물이다. 시대적 충돌이 지금,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다.
오늘의 생성형 AI는 과거의 단순 자동화 기계를 넘어섰다. 논리적 글쓰기, 문제 해결, 창의적 산출물까지 단 몇 초 만에 완성하며 인간의 학습 기준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학생들이 AI 활용에 의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에 가깝다. 평가가 여전히 '정답의 정확한 재생산'에 머무는 한 AI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반면 제도는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많은 대학이 AI를 '일단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혼란을 봉합하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
이미 현실이 된 기술을 제도와 윤리가 담아내지 못해 공백이 생기면, 학문적 정직성은 더욱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 공백이 표면 위로 드러난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은 재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I를 부정행위의 도구로만 규정하는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 AI 시대의 핵심 역량은 AI가 제공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해석을 덧붙이는 능력일 것이다.
평가 방식 또한 변화해야 한다.
단순 암기식 시험 대신, 대면 구술 평가, 심층 토론, AI 활용을 허용하되 인간의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 등 새로운 기준이 시급하다. 이는 교육계를 넘어 법률, 행정, 노동시장 전반에서 필요한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기술의 진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느린 걸음의 제도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같은 혼란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과 제도의 동반 진화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성찰과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의 윤리를 새롭게 세우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